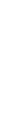News
[매일경제] 윤태성 교수 – 공항·터미널을 4차 산업혁명 학습장으로
2017.11.27
By.관리자
정부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어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기업에서는 관련 기술을 이용한 신제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대학에서는 새로운 교육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서점에 가보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제목을 단 서적 수백 권이 눈에 띈다. 이런 현상만 보면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을 활발하게 진행 중인 국가다.
하지만 국민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못하다. 4차 산업혁명은 뉴스에서만 보는 용어이기 때문이다. 책을 보며 공부해야만 알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세상이 변할 거라는 이야기를 아무리 들어도 이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 나의 생활이 변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기업도 난처하기는 매한가지다. 인공지능이다 로봇이다 해서 기술을 개발하기에만 바쁘다.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에 관한 답은 찾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에 집중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이 부분에 주의할 점이 있다. 목적을 설정하는 건 정부도 아니고 기업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목적을 설정하는 주체는 국민이다. 국민은 정책의 고객이며 동시에 기업의 고객이다. 고객은 기술 자체에는 관심이 없다. 4차 산업혁명 역시 마찬가지다. 많은 기술이 등장하고 그 결과 세상이 변한다고 하지만 세상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정하는 주체는 고객이다. 정부와 기업이 할 일은 간단하다. 고객에게 기술을 소개하는 작업에만 충실하면 된다. 고객은 정부와 기업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다양한 방식으로 기술을 이용한다. 기술에 부족한 점이 있거나 개선할 점이 있으면 고객이 알려준다. 고객이 알려준 대로 기술을 개선하고 정책을 만든다.
이런 관점에서 일본의 서비스 로봇 시장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서비스 로봇의 목적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는 정부도 모르고 기업도 모른다. 그래서 고객의 생활 속에 로봇을 집어넣고 현상을 관찰한다. 예를 들어 호텔에 도착한 고객을 로봇이 응대한다. 양로원에서는 로봇이 노인들과 함께 체조하거나 치매 예방을 위해 퀴즈 풀이를 한다. 판매점에서는 기다리는 고객에게 로봇이 커피를 타주며 대화를 나눈다.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면 로봇이 나른다. 인공지능을 강화한 로봇 반려견도 있다. 초·중학교 영어수업에서는 로봇과 학생이 영어로 대화한다. 장례식에서 불경을 읽어주는 로봇도 등장했다. 고객은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기술을 대하지만 접촉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호기심은 친숙함으로 변한다. 만약 고객이 평소에 느끼던 불편이나 불만을 해결할 수 있다면 이 기술은 순식간에 고객의 생활로 스며든다.
우리나라 고객에게 4차 산업혁명을 소개하고 기술을 선보이기 위해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공항, 터미널, 역과 같이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장소를 기술 체험장으로 만들자. 자율주행차가 승객을 나르고, 로봇 안내원이 길을 안내한다. 한국을 찾은 외국 관광객이 한국을 주제로 인공지능과 퀴즈 대결을 벌인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교훈은 여기서도 통한다. 기술을 이용한 제품을 직접 만져보고 뒤집어보고 부셔봐야 한다. 직접 체험해 기술의 가치를 이해한 고객은 자신의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한다. 이해하면 새로운 요구를 한다. 정부와 기업은 고객이 원하는 요구에 맞추면 된다. 고객의 요구는 기업에는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되고 정부에는 정책목표가 된다. 우리나라 국민은 카이스트가 개발한 로봇 휴보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로봇인 줄 안다. 뉴스에서 그렇게 보았기 때문이다. 재난로봇대회에서 1등 한 사실은 맞는다. 하지만 카이스트에 가보아도 휴보는 볼 수 없다. 뉴스에서만 보는 로봇은 고객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기술로 1등 하면 뭐하나. 내 생활이 그대로인데.
[윤태성 카이스트 기술경영학과 교수]
출처 바로가기 : http://opinion.mk.co.kr/view.php?year=2017&no=780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