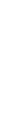News
[매일경제] 윤태성 교수 – 10년 후 미래기술 예측 신호는
2020.07.01
By.관리자
미래에 어떤 기술이 등장할지 알 수 없다. 누구도 알 수 없는 미래이지만 미래기술을 알고 싶다거나 혹은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는 요구도 강하다. 미래를 예측하고 싶으면 스스로 미래를 만들면 된다는 격언은 기술에도 통하는 바가 있다. 미래기술은 과거에 시작해서 현재를 통과하여 미래를 향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 속에는 미래기술을 알려주는 신호가 있다. 신호는 때로는 막연하게 방향만 알려주지만 때로는 굉장히 구체적이다. 10년 후의 미래기술이라면 구체적인 신호가 있다. 예를 들어 특허, 논문, 산학 협력, 이공계 분야 졸업생 숫자다. 대학의 수업 역시 어떤 기술이 새롭게 등장할지 알려주는 신호다. 기술이 보급되기 시작하면 대학의 학과명도 이에 맞추어 변한다. 특허와 논문은 미래기술을 알려주는 가장 강력한 신호다. 연구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이며 미래사업을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 특허와 논문은 연구개발에 투자한 시간과 비용에 비례해서 증가한다. 미래기술과 별로 상관없는 내용도 많아서 걸러내는 작업이 힘들기는 하지만 미래기술이 내딛는 첫걸음은 특허와 논문에서 찾을 수 있다. 논문 중에서 미래기술을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는 이공계 분야 박사학위 논문이다. 거의 모든 논문에는 향후 계획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 더해서 앞으로 추가해야 할 연구 주제나 범위를 제시한다.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이공계 대학원을 대상으로 박사학위 논문의 향후 계획만 분석하면 10년 후의 미래기술을 예측할 수 있다. 이공계 대학원에서는 연구 주제를 선정할 때 박사과정 학생은 10년 후에 필요한 주제를 생각하라고 흔히들 조언한다. 석사는 3년 후다. 취업과 기술 진화를 고려해서다.
산학 협력 역시 미래 10년의 기술을 예측할 수 있는 신호다. 기업은 모든 기술을 내부에서 개발할 필요가 없으며 그럴 능력도 없다. 기업이 개방형 혁신으로 기술을 개발하기에 가장 좋은 파트너는 대학이다. 기업은 대학에 연구비를 제공하고 필요한 시점과 원하는 수준을 제시한다. 대학은 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한다. 대학 연구실에서 창조된 기술은 수많은 실험과 시험을 거치면서 점점 능력을 키워간다. 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진화하지 않으면 미래기술이 되기 어렵다.
이공계 분야 졸업생 숫자는 미래기술 개발 인력의 공급이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신호다. 미래기술의 출발점은 호기심이나 위기감이다. 이는 사람이 가지는 감정이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기술이 스스로 새로운 기술을 창조하기는 어렵다. 이공계 졸업생이 많고 전공 분야도 다양하다면 10년 후 기술을 기대할 만하다. 대학의 수업은 어떤 기술이 창조되었는지 혹은 보급되기 시작하였는지 알려주는 신호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수업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그다지 인기 있는 수업은 아니었다. 기계학습을 비롯한 새로운 기술이 창조되면서 최근에는 거의 모든 대학에서 관련 수업을 개설하였다. 이런 추세는 대학 학과명에도 반영되어 인공지능 대학원이나 인공지능 대학으로 발전하고 있다.
미래기술을 예측할 수 있는 신호는 여럿 있지만 모든 신호에는 공통요소가 있다. 시간과 비용이다. 미래기술을 예측하고 싶으면 과거에서 현재를 지나 미래로 나가는 과정을 시간과 비용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10년 후의 미래기술이라면 지금까지 투자한 시간과 비용에 더해 앞으로도 10년 동안 계속 투자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가 올해 투자할 예정이던 연구개발 예산이 대폭 삭감될 듯하다. 연구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해치지 않을까 미래기술의 관점에서 걱정이 크다. 10년 후의 미래기술은 다양한 신호를 보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지 않으면 예측은 결코 현실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윤태성 객원논설위원·카이스트 기술경영학부 교수]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바로가기 : 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20/07/670686/